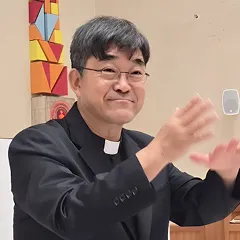|
✟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언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고, 인간이 하느님과 관계 맺도록 돕습니다. 수어 역시 특별한 은총의 선물입니다. 수어는 농인 공동체가 하느님과 이웃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언어가 빚어내는 세계, 그중에서도 한국 수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수어는 가톨릭 수도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 베네딕토 수도회 수사 페드로 폰세 데 레온은 수도원 공동체에서 수어를 배웠습니다. 오냐 수도원의 수사들은 대침묵 시간 동안 입으로 말할 수 없어 서로 소통하기 위해 360개의 수어를 개발하여 독자적인 언어 체계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수도 생활의 경험을 통해 청각뿐만 아니라 수어를 통해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베네딕토회의 수어를 농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1) 그렇다면, 한국 수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농인과 청인, 그리고 수어
먼저 올바른 용어부터 짚어 봅시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농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청인’으로 이 표현은 주로 농인 공동체 내에서 사용합니다. 때로는 농인 대신 ‘청각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농아’나 ‘벙어리’와 같은 차별적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이를 모욕적인 표현으로 간주합니다.2)
수어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시각적 언어이자 모국어입니다. 미국에서는 ‘American Sign Language’로, 중국은 ‘수어’로, 일본은 ‘수화’로 부릅니다. 북한은 손으로 하는 언어라는 의미에서 ‘손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수화’라고 불렀지만, 오늘날에는 ‘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농인들이 하나의 공통 수어를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어는 나라별로 다릅니다. 미국 수어는 한국 수어와 90퍼센트나 다르며, 중국 수어도 한국 수어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 수어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1913년, 농인을 위한 첫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한국 수어가 존재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교사들이 한국에 건너와 농학교에서 농인 학생들에게 일본 수어를 가르쳤고, 한국 농인들은 일본 수어를 배우며 서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일본인 교사들과 일본인 농학생들이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한국 농인들은 일본 수어를 그대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히라가나 지화(히라가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방법)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농인들은 일본 히라가나 지화 대신 우리나라 한글 지문자(한국수어의 자음과 모음을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방법)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1946년 9월 1일, 농학교의 한국인 교사 윤백원 선생이 연구 끝에 한글 지문자를 창안했습니다.3) 한국 농인들은 윤백원 선생을 ‘농인판 세종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농인들은 이 한글 지문자를 배워 고유명사나 수어가 없는 단어를 표현할 때 지문자를 사용하여 단어의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한국 농인들이 수어에 없는 한글 단어를 새로 만들면서 일본 수어, 한글 지문자, 새로 개발된 단어를 통합하여 ‘한국 수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농학교에서 일본 수어를 배웠던, 현재 85세 이상의 한국 농인들이 일본 농인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 언어가 된 수어, 그 의미는?
2016년 2월 3일,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 수어를 한국어와 함께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인정하고, 농인들의 언어권과 관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공용어로 인정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수어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4)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한국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 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 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에서는 “한국 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현재는 농인들의 공용어인 한국 수어의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 수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5)
수어, 나를 만드는 언어
모든 농인이 수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한국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과 한글을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이 있습니다.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은 대부분 선천적 농인, 음성 언어를 배우기 전에 청각을 잃은 농인, 출생 후 3세 이전에 청각을 잃은 농인입니다. 또한 농학교에 입학해 농학생들과 함께 기숙 생활을 했던 농인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구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농인들은 음성 언어를 습득하던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청각을 잃은 것입니다. 또한 선천적 농인이나 1~3세 무렵에 청각을 잃은 농인 중에서도 부모의 뜻에 따라 농학교 대신 일반 학교로 진학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학교에서 수어를 배울 기회가 없어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농인들은 일반 고등학교나 일반 대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 진출해 청인들과 한글과 구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한계를 느끼며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마음의 방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늦게나마 수어를 배우면서 정체성이 확실해졌고, 수어가 농인의 모국어임을 인정하며 농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어와 함께 성장한 농인 공동체
대부분의 농인들은 농학교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수어를 배웠습니다. 매일 학교와 기숙사에서 수어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한글을 읽거나 쓰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글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 그들은 모국어인 수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어를 모르는 청인들과 의사소통할 때마다 수어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했고, 직장뿐만 아니라 병원, 관공서, 서비스업체 등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통역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미디어 뉴스와 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화면 한쪽의 작은 원형 창 안에서 이뤄지는 수어 통역사의 통역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글이 제2외국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농인들은 수어를 통해 꾸준히 농문화와 공동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수어는 농인들이 삶을 영위하고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되었으며, 농인들은 수어를 통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농인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농인을 언어적 소수 집단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농인 스스로의 수어 인식이 농인 공동체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농인들은 수어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적 만족감을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어가 인간의 여타 언어와 동등하면서도 고유한 가치를 지난다는 인식은 농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어와 농문화는 농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함께하는 묵상💐
한국 수어는 농인 공동체에게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기쁜 소식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쓰는 언어로 복음의 기쁨을 어떻게 더 나눌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각주
1) Susan Plann, “Pedro Ponce de León: Myth and Reality,” in Deaf History Unveiled: Interpretations of the New Scholarship, ed, John Van Cleve,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1996, p.8.
2) 박민서, 에파타! 시노드에 응답하는 농인교회, 안종희, 으뜸사랑, 2025, p. 39-40
3) 황지연, 서울농학교 세계적 교육기관으로 만들 것, 에이블뉴스, 2013년 10월 25일
4) 유창엽, [오늘은] ‘한국수어의 날’을 아시나요?, 연합뉴스, 2022년 2월 3일
5) 한국수화언어법, www.law.go.kr/법령/한국수화언어법두 부류의 농인: 수어 사용자와 구어 사용자